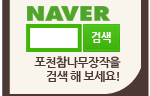사회학 전공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일이다. 인문교양서에 나온 요약본만 접했지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온전히 마주한 건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였다. 그의 생각을 읽고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자유주의를 주제로 책도 썼다.
며칠 전 너덜해진 『자유론』을 다시 꺼냈다. 최근 벌어진 진중권과 유시민의 논쟁 때문이다. 유시민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선 개입이 정당하다”며 ‘재인산성’을 옹호했다. 진중권은 “개인과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론』의 핵심이다, 위해 가능성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유시민을 반박했다.
위 내용 모두 『자유론』에 나와 있고 두 사람 다 자유주의자를 자칭한다. 그런데 한 명은 가짜고, 다른 한 명은 진짜로 보인다. 유시민은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며 집권세력의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합리화 한다. 진중권은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배신자 소리까지 듣고 있다. 한때 진보를 대표했던 두 논객이 반대편에 서게 된 이유다.
밀은 책의 첫 문단에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강조했다.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상태로 빠지기 쉽고 그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논지를 책 곳곳에서 설명했다.
기자 역시 밀의 사상을 온전히 알기 전까진 유시민과 같은 수준에서 『자유론』을 이해했다. 그러나 밀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권력에 대항하는 소수자 권리로서의 사회적 자유다. 약자를 배려하는 자유주의의 전통은 존 롤즈로 이어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정의의 원칙으로 발전했다.
현 정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모든 것을 다수의 논리로 결정하려는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그 때마다 ‘어용 지식인’ 유시민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 같은 해괴한 수사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뇌했다. 스스로 기득권이 된 탓일까. 한때 그가 지녔던 번뜩이는 재치와 냉철한 논리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총기가 빛을 잃으면서 최근의 『자유론』 오용 사태가 벌어졌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는 “멋진 문장을 구사한다고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 살면서 얻은 감정과 생각이 내면에 쌓여 넘쳐흐르면 저절로 글이 된다”고 쓰여 있다. 내면에 무엇이 그리도 쌓여 그의 언어가 변질된 걸까.
윤석만 논설위원 겸 사회에디터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3497번길 4 | HP 010-6460-5989, 010-8334-0879
- 사업자 등록번호 : 484-90-00024 | 대표자 : 강석원
- Copyright © 2015 포천참나무장작 All rights reserved.
 오늘 : 11852
오늘 : 11852 합계 : 1422189
합계 : 142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