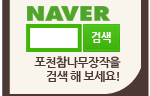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일자리, 소득, 건강, 노후 대책, 자녀 보육·교육, 주택 등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임대료, 기업·환경 규제와 재분배 보조금 등은 그런 야심에서 취한 정책이다.
흥미로운 건 그런 국가의 존재이유다. 개인을 혼자 내버려두면, 그들은 합리적 삶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로서 국가의 온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필요성에서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은 나라에 자유를 반납한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명분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강제 도입, 미래의 든든한 먹거리인 원전을 환경이란 미명 아래 없애려는 탈(脫)원전 정책, 삶을 급격히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업자를 양산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도 국가의 온정에 현혹돼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록다운 등을 권장·강제하는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과 이를 위해 국가에 자유를 반납하는 것도 온정적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온정적 사회주의의 극치는 “임대주택도 내 집과 같으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한 여권 정치인의 발언에 나타나 있다. 그런 사회주의는 통치자의 가치관이나 선호를 시민들이 따르도록 하는 간섭주의다.
유권자의 40%를 웃도는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층은 국가의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어버이처럼 나를 돌봐줄 정권이라는 믿음, 즉 어버이주의(parentalism)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어버이 같은 국가가 필요한가? 거대한 시장사회에서는 일자리나 소득, 건강이나 노후를 걱정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 낯설고 믿을 수 없는 ‘그들’만이 있을 뿐, 나를 책임져줄 ‘우리’가 없다.
어버이 품에서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은 시장사회에 대한 공포에 떤다. 자유·책임·독립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고 백신 개발도 요원한 코로나바이러스도 매우 두렵다. 공포가 만연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는다. 한때는 신(神)을 찾아 의지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이후 신은 죽었다. 신을 대신할 초인(超人)이 필요하다. 그게 어버이 같은 정권 권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기 있는 구호인 이유다.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나의 자유는 희생돼도 좋다. 국가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예속이 독립보다 좋다.
어버이주의에서 자유의 반납과 예속은 아래로부터 나온 자발성이다. 온정주의에서 자유의 반납과 예속의 발단은 위에서부터의 설득과 강요다. 애덤 스미스, 이마누엘 칸트 등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건 온정에 따른 자유의 반납이었다. 온정에서 비롯된 모든 공공정책은 독립·자율적인 인간을 국가에 의존적으로 만들어 정치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노예근성을 부추긴다. 과거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국가가 입증하듯이, 국가의 온정에서 우러나온 복지 확대는 일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 의존적 복지병을 불러왔다. 현 정권이 빚을 내서라도 현금 퍼주기에 몰두하는 이유도 자유를 두려워하는 어버이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청년 실업자를 줄이는 자유의 정책 대신 현금 뿌리기, 주택공급 증대 대신 수요 억제 정책을 펴는 것도 국가 의존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책 실패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홍보도 자유·책임과 자립심을 중시하는 시장 대신 국가권력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권력에의 예속에서 얻는 환희를 현란하게 기술한 게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던가! 그런 도피의 치명적 결과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등 문명을 파괴한 전체주의다. 그러나 노예의 삶에서 쾌락을 얻는 인간, 자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납한 자유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다.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3497번길 4 | HP 010-6460-5989, 010-8334-0879
- 사업자 등록번호 : 484-90-00024 | 대표자 : 강석원
- Copyright © 2015 포천참나무장작 All rights reserved.
 오늘 : 11797
오늘 : 11797 합계 : 1422135
합계 : 142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