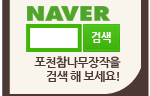영국병(英國病)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보수당)의 동상을 고향인 잉글랜드 링컨셔(州)의 그랜섬 시에 세우려는 계획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영국의 타임스는 3일 “시의원들 중에선 차라리 주민투표에 붙여 동의를 구하자”는 안(案)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인구 4만3000여 명의 그랜섬 시의회는 애초 작년 2월에 동상 건립을 위한 제막식 행사를 승인했다. 약 3m 높이의 동상은 완성된 지 오래고, 현재 비밀 장소에 보관돼 있다. 훼손을 막기 위해 이 동상을 높이 올려 세울 대좌(臺座)도 지난 3월 시(市)의 동상이 들어설 자리에 마련됐다. 5월에 제막식(除幕式)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 미뤄졌다.
지난 1일 보수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제막식 행사에 소요되는 10만 파운드(약1억4600만 원)의 예산도 승인했다. 보수당 시의원들은 “고향 도시에 그의 기념관이나 이름을 딴 도로도 없는데, 이 정도 예산 쓰는 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주장한다. 현재는 대처의 아버지가 잡화점을 운영했었던 건물 벽의 작은 동판만이 대처의 생가(生家)라는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동상 반대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당 소속 시의원은 “이런 고(高)비용 행사는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모욕”이라고 반대했고, 소셜미디어에선 2000여 명이 동상에 제막되고 나면 달걀 던지기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다. 결국 전(前) 시장이자 시의원인 이안 쉘비는 “주민 투표를 해서 동상 건립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누구도 동상을 훼손할 권리가 없다”며 주민 투표를 제안했다.
대처의 동상 건립이 이토록 논쟁적인 것은 퇴임(1990년) 30년이 되도록 그에 대한 영국 내 평가가 ‘존경’과 ‘증오’의 양극을 달리기 때문이다. 보수당 지지자들에게 대처는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강력한 노조와 싸워 이기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데 성공한 개혁의 상징이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評)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급(級)에 맞는 ‘정치적 거인’이다. 그러나 반대파가 보는 대처는 영국을 효율과 경쟁 위주 사회로 몰고, 국영기업에 의존했던 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무정(無情)한 사회’로 만들었다. 또 사실 대처 자신도 총리 재직 시 행한 많은 연설에서 고향 그랜섬을 언급한 적도 없고, 거의 방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처 조각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에는 런던 시청 건물인 길드홀(Guildhall) 내에 대리석으로 대처 전신상(全身像)이 세워졌다. 대처 자신이 제막했다. 그러나 수개월 뒤 한 시민이 철봉으로 이 대리석상의 머리를 부쉈다. 이 대리석상은 이후 복구됐다. 2007년엔 웨스트민스터 의회 내에도 세워졌다.
또 그랜섬 동상은 원래 에이브러햄 링컨, 간디, 넬슨 만델라, 윈스턴 처칠과 같은 수많은 위인이 세워져 있는 런던 시의 의회 광장(Parliament Square)에 세우려고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 당국은 과거에 “어느 한 인물에 대해, 당파적 감정이 가라앉고 차분한 회상을 할 수 있으려면 사후(死後) 최소 10년은 지나야 한다”며 두 차례나 대처의 동상 건립을 반대했다. 대처는 2013년 사망했다.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3497번길 4 | HP 010-6460-5989, 010-8334-0879
- 사업자 등록번호 : 484-90-00024 | 대표자 : 강석원
- Copyright © 2015 포천참나무장작 All rights reserved.
 오늘 : 5822
오늘 : 5822 합계 : 1431980
합계 : 143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