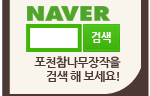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당초 징계위원장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면서 징계위 소집이 불투명해지자 하루 만에 후임자를 임명해 ‘윤석열 밀어내기’의 빈 퍼즐을 맞춰준 것이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징계위원장은 민간인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초고속 인사’를 통해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섰던 이번 사태에서 무대에 처음 서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대로, 법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청와대가 아닌 징계위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대통령과 여권(與圈) 전체가 ‘윤석열 밀어내기’를 위한 퇴로 없는 외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하고 법무부 감찰위가 절차적 흠을 지적하며 윤 총장 징계의 법적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집행한다”고 말했다.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 윤 총장은 해임된다. ‘코드 인사’ 징계위라는 비판 때문에 징계위원장은 민간인에게 맡길 방침이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문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추 장관 사퇴가 아닌 징계위와 후임 차관 인선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을 수용하면 원전(原電)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의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통령 인사(人事)에 항명하는 등 이미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며 “판사 사찰 등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밀어내기’ 과정에 침묵하면서 2선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고 문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무대에 섰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추 장관의 시간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왔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등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은 물론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거나 후퇴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과 핵심 지지층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며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배수의 진’을 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징계의 위법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를 몰각(沒却)했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징계 절차 위법을 지적한 게 아니라 검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청구의 불법·탈법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둔 뒤 징계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징계 수용을 검토할 동안 민주당은 윤 총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들며 대통령의 징계 수용을 촉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했다”며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비난 여론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3497번길 4 | HP 010-6460-5989, 010-8334-0879
- 사업자 등록번호 : 484-90-00024 | 대표자 : 강석원
- Copyright © 2015 포천참나무장작 All rights reserved.
 오늘 : 6172
오늘 : 6172 합계 : 1432330
합계 : 143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