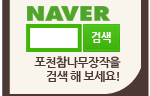연 ―김현승(1913∼1975)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나는 나의 짐이다. 맑고 고요한 내 눈물을/밤이슬처럼 맺혀보아도, 눈물은 나를 떼어낸 조그만 납덩이가 되고 만다. 가장 맑고 아름다운/나의 시를 써보지만, 울리지 않는다-금과 은과 같이는, (…) 내 속에는 아마도/납덩이가 들어 있나부다, 나는 납을 삼켰나부다,/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켜버렸나부다.
참회의 시인이라면 윤동주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김현승 시인 역시 그에 못지않은 ‘참회의 대가’다. 윤동주가 풋풋하다면 김현승은 보다 어른스럽고, 더 종교적이다. 다만 쨍하게 맑고 투명하다는 것이 두 시인의 공통점이자 장점이 된다.
참회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물로 지운다. 그런데 시와 종교에서는 더러움을 오직 눈물로만 닦아낸다. 작은 눈물방울로 온몸과 온 가슴의 더러움을 적시고, 지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회는 늘 오체투지처럼 온몸으로, 간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깨끗함만이 남는다.
이 시를 읽기 전까지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 게다가 김현승의 시는 늘 청명함으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나를 돌아보는 과정의 무겁고 더러운 세계가 깨끗한 결론보다 더 감동적일 수도 있구나. 이 시를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된다.
제목의 ‘연(鉛)’이란 흑연같이 푸르거나 어두운 물질, 혹은 납을 의미한다. 시인에게 있어 납처럼 무겁고 어두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이 사정이 시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는 보편성을 획득한다. 우리는 “나는 나의 짐이다”라는 구절에서 한참 머문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말이 새삼 무게를 더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든 건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고 가는 나의 고단함 때문이었나 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3497번길 4 | HP 010-6460-5989, 010-8334-0879
- 사업자 등록번호 : 484-90-00024 | 대표자 : 강석원
- Copyright © 2015 포천참나무장작 All rights reserved.
 오늘 : 2946
오늘 : 2946 합계 : 1429104
합계 : 1429104